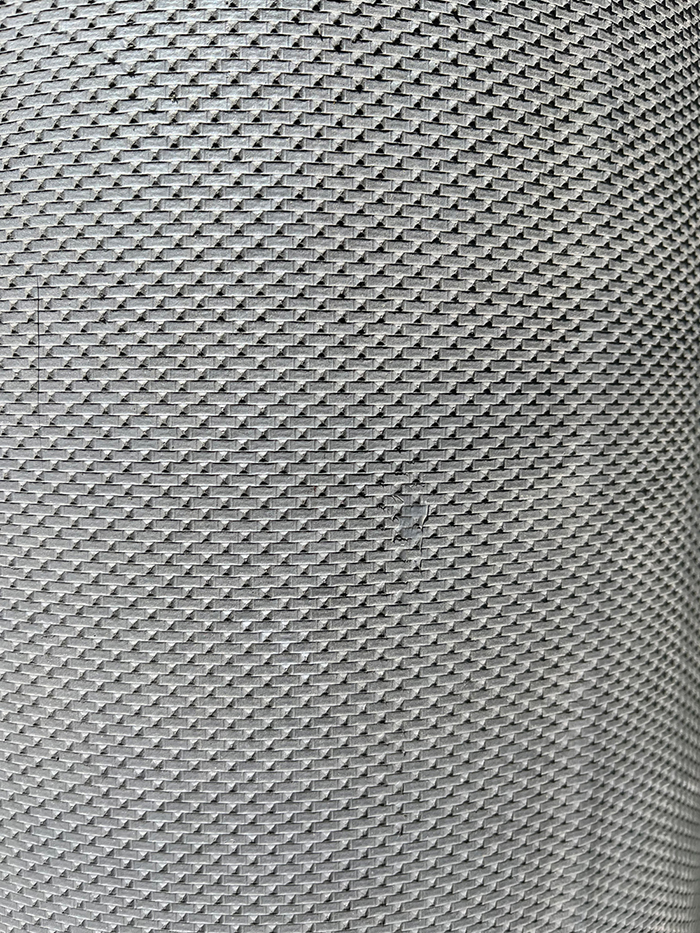






그나마의 푸르른
오늘은 근린공원에 올라서니 도시적인 삶이 비현실적으로 붕 떠올랐다. 꽤 멀리 도시가 아득히 보였고 새소리가 가득했고 공기가 상쾌했고 가까이 있는 것은 온통 푸르렀다.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나마 횡단보도가 바뀔 때마다 차들이 오가는 소리로 여기가 도시 중간임을 느끼게 했다. 공원도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공원이 안 없어질 것 같아서…. 공원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나마의 푸르른 공간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회색 가득한 도시에서 공원은 우리에겐 그나마의 푸르름을, 새들에겐 귀중한 안식처를 제공한다. 공원에선 혼자 서성이는 비둘기조차도 빛깔 좋고 여유로워 보였다. (23. 3. 27.) 타이틀
오늘은 근린공원에 올라서니 도시적인 삶이 비현실적으로 붕 떠올랐다. 꽤 멀리 도시가 아득히 보였고 새소리가 가득했고 공기가 상쾌했고 가까이 있는 것은 온통 푸르렀다.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나마 횡단보도가 바뀔 때마다 차들이 오가는 소리로 여기가 도시 중간임을 느끼게 했다. 공원도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공원이 안 없어질 것 같아서…. 공원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나마의 푸르른 공간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회색 가득한 도시에서 공원은 우리에겐 그나마의 푸르름을, 새들에겐 귀중한 안식처를 제공한다. 공원에선 혼자 서성이는 비둘기조차도 빛깔 좋고 여유로워 보였다. (23. 3. 27.) 타이틀